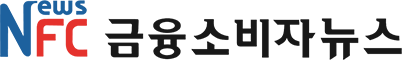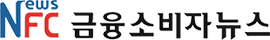10대 재벌 선임 사외이사 40%, 판·검사 등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사외이사제도가 이런 좋은 취지를 외면하고 '바람막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에 올해도 권력기관 출신들의 영입이 활발한 탓이다.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권력기관 출신을 영입해 방패막이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10대 그룹이 올해 주총에서 선임(신규·재선임)하는 사외이사 119명 가운데 39.5%(47명)는 장·차관, 판·검사,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기관 출신 비중은 지난해 39.7%(50명)와 비슷했다.
직업 별로는 정부 고위직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판·검사(12명), 공정위(8명), 국세청(7명), 금융위원회(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는 정부 고위직 가운데 장·차관을 지낸 인사의 선임이 두드러졌다. 정부 고위직 18명 가운데 장·차관 출신은 12명(66.7%)으로 지난해(6명·27.2%)의 배였다. 그룹 별로는 LG그룹이 사외이사 13명 가운데 1명만 검찰 출신으로 선임해 권력 기관 비중(7.7%)이 가장 낮았다.
기업들은 보통 권력 기관 출신들의 전문성을 보고 사외이사를 뽑는다고 하지만 사외이사 제도는 전문성보다 독립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사외이사 제도는 오너 일가로 구성된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독단적 결정을 감시
·견제하는 창구로 활용돼야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
감사제를 도입했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에 있다. 이사회의 수장은 회장(
chairman)이고, 경영진의 장은 사장(
president) 또는
최고경영자(
CEO)이다. 영국의 경우 이사회 회장이
최고경영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에서는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ㆍ공무원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이며, 감사제도도 변경할 방침이다. 독일 감사회는 근로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한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인 주주총회ㆍ감사ㆍ이사회 가운데 2개 기관에 대한 임원 선임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이제까지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 있어서도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달 주총을 앞두고 최근 사외이사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해 대기업그룹 사외이사들은 상정된 이사회 안건에 대해 99.7%의 찬성표를 던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탓이기도 하다.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점차 대기업 오너의 '화려한 방패'로 변해가는 사외이사제도를 이제는 수술해야 하지 않나 싶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