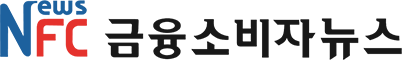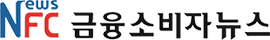9년 째 2만달러 수준 머물러..경상성장률도 3%대 고착화

그런데 이게 왠 일인가.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GNI 3만달러 임박소식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25일 한은이 내놓은 ‘2014년 국민계정(잠정치)’을 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3.9% 성장(명목 국내총생산 기준, 실질 경제성장률은 3.3%)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968만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3.5%(101만3000원) 늘어났다. 달러로는 7.6%(2001달러) 늘어난 2만8180달러에 이르렀다. 달러환산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원화가치가 지난해 3.8% 올라서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소득을 빼고 국민 개인의 주머니 사정을 볼 수 있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세금·연금 등을 빼고 개인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소득)은 3.3% 늘어나는 데 그쳐,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3.5%)에 못 미쳤다. 또 가계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 실질 소비는 실질 경제성장률(3.3%)을 크게 밑도는 1.8% 증가에 그쳤다. 가계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소비지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아직 활력이 미약하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에서 2013년 2.9%, 지난해 3.3%로 매우 완만한 속도로 높아졌다. 가계가 지출을 억제해 소비가 부진한 것이 경제 활력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난해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실질 민간소비증가율은 1.8%로 2009년(0.2%) 이후 가장 낮았고, 3년째 1%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계의 소득 증가도 부진했지만 부채 상환이나 불안한 앞날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계순저축률은 6.1%로 2004년(7.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저축률이 높은 것은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계 소비성향이 낮아진 점은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질 낮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고 자영업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민소득 증가만큼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자 가계가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문제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8180달러를 기록하며 2006년 이후 9년째 2만달러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올해도 3만달러 고지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로 원화절상 등 환율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더구나 가계 빚이 가계 가처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 대출과 카드사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0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세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비율)를 완화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리면서 지난해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항상 소비다. 지난해 국가 전체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둔화됐고 그 결과 저축률은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에는 연 4%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대세를 이뤘지만, 4월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됐다.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시지퍼스는 신들로부터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올리는 형벌이다. 힘겹게 바위를 밀어올려 산꼭대기에 다다르면 바위는 아래로 굴러간다. 그렇게 떨어진 바위를 다시 산꼭대기로 올리면 바위는 또 아래로 떨어진다. 신화는 시지퍼스의 이 '고역'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전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2만달러·경상성장률 3%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곧 눈앞에 다가올 듯 보였지만, 9년째 2만달러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상성장률 또한 3%대로 고착화되고 있다. 성장엔진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소비·투자 부진이 반복되는 것이 그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은 지금 3만달러라는 숫자에 크게 흥분하거나 개의치 않는 듯 하다. 오히려 그보다는 현실을 옥죄는 실업과 다가오는 노후대책에 더 고민하는 듯 하다.
“국민소득이 곧 3만달러에 이른다는데,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건 물가상승률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고 노후대비도 해야 하고, 주택 대출금도 곧 원금상환을 시작해야 하니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당연하지요.”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