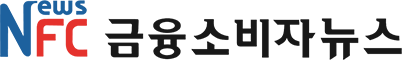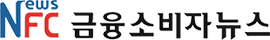'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그동안 만연하던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2년6개월만에 통과된 이 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습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형량보다 50%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보험사가 금융당국을 끼고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원안에서 거론됐던 보험사기를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점은 아쉽다. 당국이 조사권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조사 전담조직이 신설되지 못한 점은 지난 2013년 9월 금융위원회 내에 구성된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신설과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조단은 법적 근거에 따라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를 직접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법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구채적으로 보면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 또한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조항이 문제이다.
입원은 보험계약자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을 하여서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 일부 잘못된 병원의 허위 또는 과다 입원급여금을 부당 수령은 당연히 보험사기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의 입원이 적정한 지에 따라 보험사기로 규정 짓는 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즉,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치료한 의사가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하였는지 따져서 부당치료를 한 의사를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 보험계약자는 의사가 입원을 하라 해서 입원을 한 것이다. 만일 이 자체가 보험사기라고 한다면 대다수가 보험사기범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과 방지특별법은 환영하지만 교묘하게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가는 제7조는 분명히 문제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최고의 악법’이 될 소지가 크다. 입원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그 치료비가 적정한 지를 심사, 부적절한 입원이라면 그 금액은 물론 부당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해야지 보험계약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보험사기 특별법에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보험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국회에서 신설했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