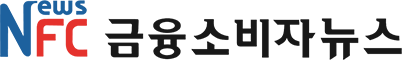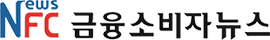금융당국, 실손보험 전환율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보험업계 부담 가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보험료 인하와 설계사 인센티브 제공을 내세워 4세대 전환을 꾀했지만, 높아진 자기부담금 비율과 의료 이용 제한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전환비율이 0.7%에 그쳤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에 대한 보험료를 많이 청구한 사람에겐 보험료를 할증하고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7월부터 고객을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 ▶4세대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실손 상품 구조상 일부 가입자들이 과잉의료로 보험금 수령을 악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내놨지만 가입자들의 전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천977만명으로 1세대는 22.1%, 2세대는 49.2%, 3세대는 24.6%, 4세대는 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건수는 약 21만1000건으로 전환율은 0.7%에 불과했다.
구세대 상품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높아진 자기부담금 비율과 의료 이용 제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4세대 실손보험은 구세대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아진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졌다.
4세대 실손의 자기부담비율은 급여가 20%, 비급여가 30%로 구성된다. 통원 공제금액도 급여는 최소 1~2만 원, 비급여는 최소 3만 원으로 오른다. 반면 구세대 상품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보장도 줄어들었다. 도수치료의 경우 3세대 실손은 치료 목적인 경우만 확인되면 연간 50번까지 보장했지만, 4세대에서는 10번 단위로 치료 효과가 확인돼야 보장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1~3세대 상품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적은 등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돼 적자 폭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1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단행됐다”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세대 실손 상품을 설계해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전환율을 보험리스크 통제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히면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기존 상품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경영실태평가에 전환율을 반영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