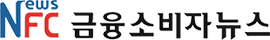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 다른 선진국 비해 절반 수준...2020년 기준 국내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는 1.34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치인 2.84배에 한참 못미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22년째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RP(환매조건부채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도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2001년 1월 이래 22년째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예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 가입자인 금융사들은 예금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기금으로 부실이 발생한 금융사의 예금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준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21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경제수준에 맞춰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년 제기됐으나 금융위의 소극적 대응으로 현실화하진 못했다.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다른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으로 확인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는 1.34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치인 2.84배에 한참 못미친다.
실제 달러화 기준 국내 보호한도는 4만2373달러(약 5050만원)로, 미국(25만 달러)·영국(10만8974달러)·일본(9만3650달러)·캐나다(7만4627달러)보다 크게 낮다. 1인당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11만3636달러)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